NOVEL_김은경의 이야기 3. 빈집
본문
빈 집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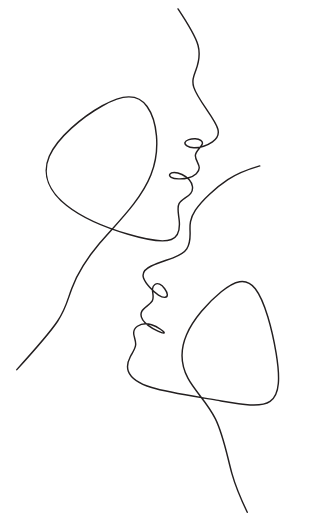
창을 열자 머리 위로 골목길이 보였다. 실내에 고인 쿰쿰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갔다. 집안으로 한기가 천천히 밀려들었다. 민철은 보일러의 온도를 높이고 벽과 천장을 살폈다. 며칠 전 진눈깨비가 내렸지만 집안에 습기가 스민 흔적은 없었다. 폐허처럼 누추하고 한심했던 집이 새 벽지를 발라 말끔해졌다. 바닥도 잘 말랐다. 민철은 휴대폰을 꺼내 집안 여기저기를 촬영했다.
몇 달 전 이 집은 덜 짠 빨래를 널어놓은 것처럼 물기로 흥건했다. 전에 없이 긴 장마에 반지하 낡은 공간은 스미는 습기를 감당하지 못했다. 벽과 천장에는 꽃처럼 검은 곰팡이가 잔뜩 피었고 얼룩졌다. 곰팡내에 비 냄새가 섞였고 매캐한 공기로 목이 간질거렸다.
“민철아, 부탁 좀 해도 돼? 내 집 좀 봐 줄 수 있어?”
수화기 너머 은수의 목소리에 미세한 균열이 묻어났다. 초등학교 동창인 은수의 부탁은 의외였다. 혼자 감당하겠다고, 도움은 필요 없다는 말보다 차라리 고마웠다. 은수는 집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보냈다.
은수는 얼마나 오래 이 집에서 살았던 것일까. 은수는 이 허름한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했다. 그 사실이 민철의 마음을 흔들었다. 은수는 유방암 수술 후 지방의 한적한 요양병원에서 몇 달째 입원 중이라고 말했다.
집안은 적막했고 공기는 잔잔했다. 민철은 눈을 감았다. 그는 이곳에서의 은수를 떠올렸다. 이 집이 담고 있는 은수의 낮은 한숨 소리와 혼잣말 같은 것들이 들려오는 듯했다. 이 집은 단지 집이 아니라 그녀를 품은 둥지였을지도 몰랐다. 민철은 손을 뻗어 벽을 쓸었다.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. 이전의 얼룩과 곰팡이의 기억은 흔적 없이 지워졌다. 그러나 이 집에 깃든 은수의 시간은 사라질 수 없었다.
“이 집 괜찮네.”
민철의 낮은 목소리가 집안에 퍼졌고 하얀 벽이 그의 말을 흡수해버렸다. 집안에 서서히 온기가 감돌았다.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.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. 평소 바라고 원하던 차분함을 느낄 수 있었다. 은수가 느꼈을 고요함과 같은 것일까. 그 고요가 더 많은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 같기도 했다. 커피를 끓일 걸 그랬나. 잠시 더 이곳에 머물고 싶어졌다.
그는 휴대폰을 열었다. 은수에게 집 사진을 보냈고 몇 장의 고지서 사진도 보냈다. 인기척이 나서 돌아보니 창밖으로 털부츠와 강아지가 지나가고 있었다. 민철은 가만히 미소 지었다. 빈집은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지. 민철은 보일러를 외출기능으로 바꾸었다. 이 공간에서 은수를 만난다면 어떤 기분일까. 창문들도 찬찬히 닫아 걸었다. 집을 나서며 그는 생각했다. 도배는 잘 되었다고, 집은 여전히 따뜻하다고 은수에게 전해야겠다고.
**작가 소개/ 김은경_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했다. 2021년 경기히든작가 수필 부문 당선 후, 단편소설집(공저) <그해여름 오후2시> <매화로 48번길> <소설을 좇는 히치하이커>를 출간했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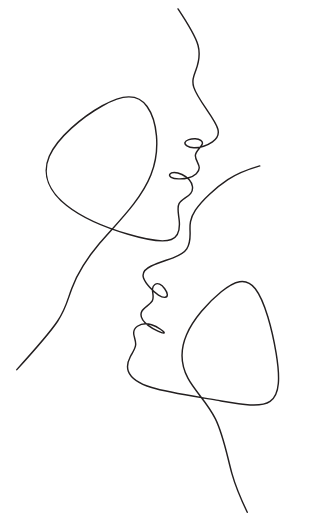
창을 열자 머리 위로 골목길이 보였다. 실내에 고인 쿰쿰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갔다. 집안으로 한기가 천천히 밀려들었다. 민철은 보일러의 온도를 높이고 벽과 천장을 살폈다. 며칠 전 진눈깨비가 내렸지만 집안에 습기가 스민 흔적은 없었다. 폐허처럼 누추하고 한심했던 집이 새 벽지를 발라 말끔해졌다. 바닥도 잘 말랐다. 민철은 휴대폰을 꺼내 집안 여기저기를 촬영했다.
몇 달 전 이 집은 덜 짠 빨래를 널어놓은 것처럼 물기로 흥건했다. 전에 없이 긴 장마에 반지하 낡은 공간은 스미는 습기를 감당하지 못했다. 벽과 천장에는 꽃처럼 검은 곰팡이가 잔뜩 피었고 얼룩졌다. 곰팡내에 비 냄새가 섞였고 매캐한 공기로 목이 간질거렸다.
“민철아, 부탁 좀 해도 돼? 내 집 좀 봐 줄 수 있어?”
수화기 너머 은수의 목소리에 미세한 균열이 묻어났다. 초등학교 동창인 은수의 부탁은 의외였다. 혼자 감당하겠다고, 도움은 필요 없다는 말보다 차라리 고마웠다. 은수는 집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보냈다.
은수는 얼마나 오래 이 집에서 살았던 것일까. 은수는 이 허름한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했다. 그 사실이 민철의 마음을 흔들었다. 은수는 유방암 수술 후 지방의 한적한 요양병원에서 몇 달째 입원 중이라고 말했다.
집안은 적막했고 공기는 잔잔했다. 민철은 눈을 감았다. 그는 이곳에서의 은수를 떠올렸다. 이 집이 담고 있는 은수의 낮은 한숨 소리와 혼잣말 같은 것들이 들려오는 듯했다. 이 집은 단지 집이 아니라 그녀를 품은 둥지였을지도 몰랐다. 민철은 손을 뻗어 벽을 쓸었다.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. 이전의 얼룩과 곰팡이의 기억은 흔적 없이 지워졌다. 그러나 이 집에 깃든 은수의 시간은 사라질 수 없었다.
“이 집 괜찮네.”
민철의 낮은 목소리가 집안에 퍼졌고 하얀 벽이 그의 말을 흡수해버렸다. 집안에 서서히 온기가 감돌았다.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.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. 평소 바라고 원하던 차분함을 느낄 수 있었다. 은수가 느꼈을 고요함과 같은 것일까. 그 고요가 더 많은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 같기도 했다. 커피를 끓일 걸 그랬나. 잠시 더 이곳에 머물고 싶어졌다.
그는 휴대폰을 열었다. 은수에게 집 사진을 보냈고 몇 장의 고지서 사진도 보냈다. 인기척이 나서 돌아보니 창밖으로 털부츠와 강아지가 지나가고 있었다. 민철은 가만히 미소 지었다. 빈집은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지. 민철은 보일러를 외출기능으로 바꾸었다. 이 공간에서 은수를 만난다면 어떤 기분일까. 창문들도 찬찬히 닫아 걸었다. 집을 나서며 그는 생각했다. 도배는 잘 되었다고, 집은 여전히 따뜻하다고 은수에게 전해야겠다고.
**작가 소개/ 김은경_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했다. 2021년 경기히든작가 수필 부문 당선 후, 단편소설집(공저) <그해여름 오후2시> <매화로 48번길> <소설을 좇는 히치하이커>를 출간했다.
관련자료
댓글 1
SVK관리자님의 댓글
- 익명
- 작성일
은수야 ㅠㅠ










